2017.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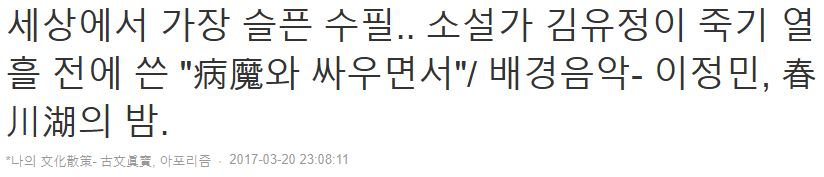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슬픈 隨筆..

病魔와 싸우면서
兄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가 못하다. 밤에는 不眠症으로 하여 괴로운 時間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猛烈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달리 道理를 차리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겠다.
兄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病魔와 最後의 談判이다. 興敗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時急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兄아!
내가 돈 百圓(백원)을 만들어볼 작정이다.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좀 協助하여주기 바란다. 또다시 探偵小說을 번역해보고 싶다. 그 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허니, 네가 보던 중 아주 大衆化되고, 興味있는 걸로 두어 卷 보내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 50日 以內로 譯하여, 너의 손으로 가게 하여주마. 허거던 네가 極力 周旋하여 돈으로 바꿔서 보내다오.
兄아!
勿論, 이것이 無理임을 잘 안다. 無理를 하면 病을 더친다. 그러나, 그 病을 위하여 無理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의 몸이다.
그 돈이 되면, 우선 닭을 한 30마리 고아먹겠다. 그리고 땅군을 들여, 살모사 구렁이를 十餘 뭇 먹어보겠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궁둥이가 쏙쏘구리 돈을 잡아 먹는다. 돈, 돈, 슬픈 일이다.
兄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依支하여 光明을 찾게 하여다오.
나는 요즘 가끔 울고 누워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다오. 기다리마.
3月 18日
金 裕 貞으로부터
제가 이 隨筆을 처음 읽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박통(朴統)'이 막, 維新統治를 강화시켜 나가던 살벌한 때였었는데, 그 서슬퍼런 時期 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文學會를 결성하여 詩를 짓고 小說과 隨筆을 쓰며 여기저기 때지어 몰려다니면서 純粹(순수)니, 무구(無垢)니 하면서도 '世上이 좀더 나아졌으면..'하는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닥치는대로 읽고 쓰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하도 긴박하게 돌아가다보니 社會性을 띤 鎭重한 글보다는 애써 밝고 自然親和的이며 小市民들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룬 글을 쓸 수 밖에 없어 그에 걸맞는 作家들의 글을 찾아 읽었고, 그 결과 金裕貞의 소설이 제겐 딱 맞춤이었던 셈이지요.
또한 金裕貞의 소설이 近代人의 虛無主義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虛無主義를 정면으로 다루어 심각한 인상을 주는 대표적인 작가인 투르게네프와는 구별되는 文體가 좋아 그를 따라 흉내를 낼 만큼 제게는 아주 특별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 隨筆을 읽기 전까지 저는 作家 金裕貞을 그저 웃기는 이야기만 잘하는 재미난 이야기꾼인줄 만 알았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동백꽃]과 [봄봄]의 江原道 산골 총각 처녀들이 펼치는 質樸(질박)한 그 얘기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던 만큼 金裕貞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당연히 이름 字에도 들어 있듯이 '넉넉'하리라고만 생각했던 게지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들을 남긴 마지막 3년은, 그가 싸워온 고질병인 늑막염으로 인한 폐결핵과 합병증으로 그의 肉身이 한없이 피폐해져 갈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작품들을 쓴 裏面(이면)에 처해 있던 극한적인 환경은 그가 죽기 열흘 전에 남긴 마지막 저 글에서 고스란히 들어나 있어, 글을 읽는 내내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정(金裕貞, 1908.1.11∼1937.3.29) : 소설가.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증리(일명, 실레 마을)에서 대지주의 2남 6녀 중 막내 일곱 째로 출생. 휘문고보(徽文高普)를 거쳐 연희전문(延禧專門) 문과를 중퇴(1928). 늑막염이 발병, 전국 각지로 방랑생활을 시작함(1930). 고향 春城 실레마을에서 '금병의숙(錦屛義塾)'을 설립, 문맹퇴치운동을 함(1932). 1932년부터는 동아일보사가 펼친 브나로드 운동에 가담, '농우회(農友會)' 조직, '금병의숙(錦屛義塾)'을 세워 야학(夜學)을 시작했으나 그만두고 1933년 서울로 다시 올라와 소설을 쓰기 시작하나 건강은 더욱 악화. 1932년 처녀작 단편 <심청> 탈고(발표는 1936년), 1935년 단편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노다지>가 중앙일보(中央日報) 중외일보(中外日報)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데뷔. 1937년 3월29일(아침 6시 30분) 廣州 누님 집으로 옮겨 身病을 치료하다 별세. 한때 <구인회>에 가담하기도 했으나 심한 폐결핵으로 29세로 요절.
1968년 作故 31周忌日에 강원도 춘성군 의암(옷바위,衣巖)에 시비(詩碑)가 세워짐.
【소설】<만무방>(1935) <노다지>(1935) <금따는 콩밭>(1935) <봄봄>(1935) <산골>(1935) <소낙비>(1935) <떡>(1935) <산골>(1935) <안해>(1935) <산골 나그네>(1936), <정조>(1936) <동백꽃>(1936) <심청>(1936) <슬픈 이야기>(1936) <봄과 따라지>(1936) <가을>(1936) <봄밤>(1936) <이런 음악회>(1936) <야앵>(1936) <옥토끼>(1936) <두꺼비>(1936) <생의 반려>(1936) <따라지>(1937) <땡볕>(1937) <연기>(1937) <정분>(1937) <두포전>(1939.사후발표) <형>(1939.사후발표) <애기)(1939.사후발표)
【번역소설】<귀여운 소녀>(1937)
【수필】<조선의 집시>(1935) <나와 귀라미>(1935) <오월의 산골짜기>(1936)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까>(1936) <신복을 등진 정열>(1936) <길>(1936) <밤이 조금만 짧았드면>(1936) <문단에 올리는 말슴>(1937) <강원도 여성>(1937) <네가 봄이런가>(1937)
金裕貞 生家 마당

春川湖의 밤 - 노래 이정민
작사 유경희, 작곡 이철혁
음원- 1966 오아시스 OL 12507
안개 짙은 湖畔을 나 혼자 거닐면
흘러간 그 옛날이 다시금 그리워
소리 없이 마음을 흔들어 주네
이 밤을 혼자만이 보내야 합니까
落葉 따라 맴도는 그리움 한 없이
春川湖 밤과 함께 내 곁을 떠납니다.
昭陽江邊 길 따라 속삭인 사연
지금은 꿈과 같이 사라졌어도
그 그림자 다가와 안아줍니다
못 잊는 아쉬움에 울어야 합니까
배 지나는 물결에 추억은 한 없이
春川湖 밤과 함께 내 곁을 떠납니다.

(1966 오아시스 OL 12507) 아름다운 江原山川, 春川湖의 밤/너무했어요
1. 춘천호의 밤/ 이정민
2. 감자바위/ 김상국
3. 뽕 따는 평창아가씨/ 송춘희
4. 아름다운 강원산천/ 금호동
5.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이씨스터즈
6. 우리의 노래/ 블루벨즈
1. 너무했어요/ 송춘희
2. 백년가약/ 송춘희
3. 날 속였네/ 송춘희
4. 대추나무골 큰 애기/ 송춘희
5. 내 낭군/ 송춘희
6. 총각 바람 처녀 바람/ 송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