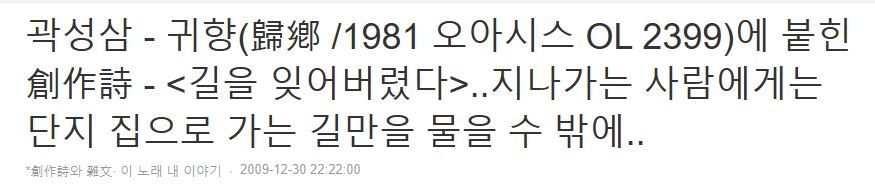
귀향(歸鄕)
작사 작곡 노래 - 곽성삼/ 편곡 연석원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 험한 산 고개 넘어
끝없는 나그네 길 이제 쉴 곳 찾으리라
서산의 해 뉘엿뉘엿 갈 길을 재촉하네
저 눈물의 언덕 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
지나는 오솔길에 갈꽃이 한창인데
갈꽃 잎 사이마다 님의 얼굴 맺혀있네
길 잃은 철새처럼 방황의 길목에서
지쳐진 내 영혼 저 하늘 친구삼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 초저녁 별이 되리
내 영혼 쉴 때까지 나 소망을 노래하리

(1981 오아시스 OL 2399) 길 - 곽성삼 / 귀향
1. 귀향
2. 한 여름밤의 숲
3. 어둠속에 피는 꽃
4. 뱅뱅뱅
5. 어기야 디여 어기야 디여
6. 우리의 소원
1. 나그네
2. 에헤야 데헤야
3. 길손
4. 강, 숲, 하늘
5. 소생

길을 잊어 버렸다.
몇 번이나 지나다녔던 이 길을
아뿔사, 어쩌자고 그 사이 잊어버리다니..
-아침 저녁으로 그냥 산보나 하자고
빠른 걸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걸었던 것을 후회한다.-
길을 잃어 버렸다.
사위(四圍)는 이미 어두워지고
희미해진 내 기억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가 어디인가.
도대체 어떻게 왔길래 내가 지금 이 곳에 서 있는가.-
길을 놓쳐 버렸다.
벌써 몇 번째, 나는 빠져 나오려고 했지만
다시 그 자리 그저 빙빙 돌기만 할 뿐,
낭패일세, 망각의 늪에 빠진 나는 이제 아예 자신이 없다.
- 생각보다 깊다.-
어이할까..
휘황한 불빛, 밤을 잊은 가게의 폭죽 소리는 이리도 가까운데
내가 갈 길은 아직 저리도 멀다니--
먼 길을 걷다 보면 바람이 되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소리를
왕왕 들을 수가 있다.
윙윙 바람이 되어 금방 날라가는 그 것에서 나는 번쩍,
드디어 가는 길을 찾았다.
-그 길은 '인생의 길'이었다.-
그렇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는 무작정 앞만 보고 걸어가지 말고
옆으로도 가보고 때로는 뒤를 보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한다.
부근의 샛길을 모르고서는 질러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단지 집으로 가는 방향만을 물을 수 밖에 없다.-
[2009년 8월 1일 中國 四川省 樂山市에서
길을 잊어 버렸던 날의 메모장에서의 편린(片鱗)]..
| 고향모정 | |
| 2009-12-30 |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
| 살다보면 어떤 책이나 영화를 한 번도 읽거나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題目이나 標題, 혹은 인상 깊은 멋진 文句나 名臺詞 때문에 특정한 책, 영화를 강렬하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로서도 소개된 된 탓에 더 더욱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제하'님의 단편소설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도 역시 마찬가지... 나름대로 평소 제법 책을 많이 읽는다는 多讀家로 치부하는 저이지만 이 책은 그저 제목만 알 뿐 그 내용은 정말 깜깜했었는데 저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살아온 올 일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싯점에서, 그동안 제가 회원님들에게 자주 인사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와 함께 최근의 제 근황을 알릴 겸해서 올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현듯이 떠오르는게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중략> ........저 詩를 썼던 밤을 기억합니다. 그 날 따라 그 전 날 까지 四川省의 다른 여러 도시를 돌아보다가 마침 주말이 되어서(8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樂山으로 돌아왔는데, 여장을 풀어 놓기가 바쁘게 집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쯤 떨어져 있는 이 도시에 와서 친하게 된 아는 분의 아파트에 잠깐 들릴 일이 생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갈 적에 당연히 걸어갔던 저는 그곳에서 밤 10시 반, 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볼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습관대로 다시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바삐 밤길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두 1~2 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걷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분 걸었을 때, 갑자기 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둠과 함께 귀를 찟는 듯한 천둥소리와,우산을 날려버릴 만큼의 바람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우산이 있었지만 워낙 거센 비라서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골목에 뛰어들었고, 장대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끝없이 퍼붓는데도 어느 집 가게의 개업 폭죽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이 타닥타닥 쉼없이 들리더군요. 얼마 후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아 다시 나온 거리는, 아~! 이 거리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거리이더군요. 더구나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세찬 비가 오는 깊은 밤, 이미 지나가는 택시는 보이지 않고.., 저는 망연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제 지인이 사는 대단지 아파트의 동과 호실 번호를 모른다는것, 제가 옷을 갈아 입고 바삐 나오느라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그 쪽(제 통역)과는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튼 그 날, 장장 2시간 30여 분을 헤맨 끝에 간신히 집을 찾았고, 다음 날 궁금하기도 하여 전 날 헤매었던 그 곳을 다시 찾았드니, 어렵쑈... 그게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 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다니... 어쨌거나 그 날의 강렬했던 기억으로 다시 찾은 그 길에 대한 잊지 못할 그 경험이 결국 이 詩를 쓰게 했고 이 일이 어쩌면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저의 詩作활동의 始作을 알리는 그 어떤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생각과는 달리 매일 걷는다는 것이 참 힘들었섰는데 '어쩌면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작심하고 중국에 온 이후, 이왕 걸을 작정을 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애초에는 여유 있게 이국 풍경을 음미하면서도 건강 관리까지 할 수가 있는 가벼운 산보를 겸한 '걷기'를 시작하였으나 이제 '걷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 지킴이인 동시에 日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쩌면 '四川의 한국인 포레스트 검프'로 불리워질 날이 올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하 생략> |